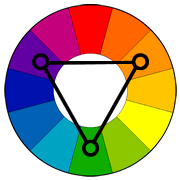다시 무라카미 하루키…
(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상실의 시대”이후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 빠져 그의 책 대부분을 읽었으나
“1Q84”를 읽다가 더 이상 공감이 가지 않아 중간에 집어 던지고- 한번 책을
잡으면 아무리 재미없어도 덤성덤성 읽더라도 끝까지는 보는 편인데 중간에
집어 던진 것은 신경숙의 그 유명한 “엄마를 부탁해”까지 몇 권 되지 않는다.
“1Q84” 또 “엄마를 부탁해”를 중간에 포기한 것은 다음 기회가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그 이후 하루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끊고 있어서 지난해 요란한
광고와 함께 뭐 출간 7일 만에 100만부 돌파했고 또 예약판매도 했고 등등..
하여간 우리나라에도 아직 하루키를 극복 못한 매니아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그러러니하고 지나갔는데,
동네 북 카페에 비치되었다는 안내문은 보았으나 다들 열심히 빌려 보는지 책
구경도 못하다가 엊그제 가보니 그 책이 눈에 띈다..
이 책 저 책 마땅히 볼만한 책도 없어 그래 한번 읽어보자 싶어 갖고 와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독파하다.
하루키 특유의 짧은 쿨한 문체, 데카당한 분위기, 불투명 수채화 같은 장면들 등등
상실의 시대에서 보여주었던 그 분위기가 다시 가득하다.
그런 니힐한 –‘허무한’이란 표현보다 영어로 ‘니힐한’ 이라고 쓰는 것이 좀 더 다른
느낌이다. 허무라고 쓰면 마치 동양적인 도가의 분위기인데 반해 니힐이라고
하면 모던한 느낌, 허무까지는 가지 못한 중간 단계의 느낌이 난다.. 물론 다분히
내 주관적 느낌이지만- 분위기의 소설들은 다시 읽으면 처음 읽었을 때 받았던
산뜻한 그런 느낌은 다시는 없겠지만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을 볼 때마다
그냥 처음 읽었을 때의 느낌이 좋아 몇 권 아직 갖고 있다.
“해변의 카프카” “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 “먼 북소리” “하루키 일상의 여백” 물론
“상실의 시대”도……
나는 개인적으로 질질 늘어진 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김훈의 글을 좋아했고- 물론 또 김훈이 쓴 것 대부분 독파- 그래서
또 쿨한 느낌의 하루키의 글을 좋아한다.
그리고 작자가 자기 감정에 빠져 헤매는 스타일 보다는 김훈이나 하루키처럼 마치
창 밖에서 상황의 전개를 덤덤히 쿨하게 보고 담백하고 긴박감이 있게 묘사하는
글을 좋아한다.
단지 김훈의 글은 드라이하고 하루키의 글은 약간 젖어 있으면서 색깔이 있는
느낌을 갖는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제목도 기억하기 힘든 그러나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제목을 몇 번이고 속으로 되새겨 가면서 읽는다.
전편에 걸쳐 물리적으로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들리는 리스트의
피아노곡 Le Mal du Pays ( 전원풍경이 사람의 마음에 불러 일으키는 영문 모를
슬픔 정도의 의미) 를 깔고 북유럽의 깔끔하면서도 축축한 느낌- 상실의 시대에서
보여주었던 자작나무숲의 그 느낌- 그리고 일본 특유의 정갈하고 또 니힐한
느낌들이 매력 있게 이리 저리 복선을 깔고 흥미 있고 스토리의 구성을 끌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마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과 같은 느낌도 받고 또 “지성과 사랑
( 나르시스와 골드문트) 의 느낌도 강하게 받는다.
물론 배경이나 또 내용, 구성은 전혀 다르지만
결국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상실의 시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삶의 일회성, 허무성, 부질없음, 사소함 등등의 단계를 극복하고 있는,
삶의 중간 중간 죽음과도 같은 고비들을 특별히 요란하지 않게 책 제목 그대로
색채가 없게 조용히 속으로 대면하면서 극복하고 있는 삶들을 그려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글쎄 남들은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고..
그냥 허무해서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느낌, 더 나아가서 자살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그러면서
긴장감 있게 글을 끌고 가는 하루키의 글 솜씨가 역시 대단하다고 느낀다..
그러니 전세계에 그렇게 많은 그의 매니아층을 만들고 있겠지만..
뉴에이지 피아노곡을 듣고 있노라면 조용한 평화로운 느낌을 갖게 되지만
뭔가 클래식 뮤직과는 다른 느낌..
마치 하루키의 소설들 몇 개는 이런 분위기의 대비가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뉴에이지의 음악처럼 가볍고 감상적이고 그러면서 가슴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렇지만 우리 심연에 있는 그 깊은 곳까지는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느낌.
현대인들의 삶과 잘 어울리는 모던하고 쿨하고 그러면서 심연에 있는 본질에는
아직 다가가지 못하는 아니 다가가지 않는 피차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가벼운 느낌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라면 한계.
글을 읽는 동안 내내 일본 출장 시 어느 조그만 마을 아담하고 깨끗한 레스토랑
에서 –음식점이라고 쓰는 것보다 레스토랑이라고 쓰는 게 더 하루키 소설에
대한 얘기를 쓰는데 어울리는 것 같다- 창가에 놓여 있던 그랜드 피아노가
떠올랐고 또 북유럽의 축축한 그러나 끈적거리지 않는 그 느낌이 떠나지 않는다.
'책(Book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만화의 이해(Understanding Comics) (0) | 2014.05.29 |
|---|---|
| 2014 이상 문학상 작품집 (0) | 2014.05.21 |
|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7권 (0) | 2014.05.18 |
| Klimt, 황금빛 유혹 (0) | 2014.05.15 |
| 돈이 돈을 버는 세습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 (0) | 2014.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