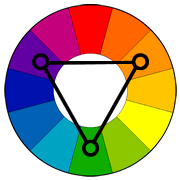애도하는 사람, 텐도 아라타 지음, 권남희 옮김, 문학동네 발간, 2008. 648쪽
' 쇠뿔도 단김에 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지난 주에 읽었던 번역작가 권남희가 쓴 책에서 강추한 일본
소설 중의 하나인 '애도하는 사람' 을 읽었다.
책을 읽기 전에 도대체 어떤 소설이기에 강추를 하는가 여기 저기 인터넷에 찾아보니 140회 나오키 상을
수상했다고- 나오키 신주고라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인데 1935년에 시작했다니 역사가 정말
오래된 문학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영화화되기도 했고 한국에서는 연극으로도 만들어졌다고
칭찬 일색이어서 기대를 갖게 한다.
거기다 더해서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인 소설가 이노우에 하사시라는 사람은 이 소설을 두고 ' 삶과 죽음과
사랑이라는 인간의 삼대 난문을 정면에서 도전했다. 도스토옙스키 뺨치는 이 뺴짱있는 문학적 모험에 경의를
표한다' 라고 한껏 치켜 세운 글을 읽고 읽기도 전에 소설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다.
또 책 말미에 번역가 권남희씨가 쓴 역자 후기에도 이 책 한권으로 인생관이 바뀔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까지
-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책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썼을 수도 있을테고 - 아무튼 찬사 일색이었다.
결론적으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책의 내용은 직장을 잘 다니던 시즈토라는 청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 일면식도 없었던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는
이야기로 옴니버스 형식으로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켜 엮어가는 내용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작가는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에 관한 성찰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핵심 메세지는 책 431쪽에 써있는 " 당신을 애도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이 세상에 넘쳐나는 죽은 이를 잊어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차별당하거나 잊혀져가는 것에 대한 분노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별 볼일 없는 사망자로 취급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세상에 만연한 이런 부담감이 쌓여서, 그리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어떤 이를 즉 당신을
애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라는 귀절이라는 생각이다.
소설의 스토리를 굳이 요약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개인적인 평을 간단히 써 보자면..
어찌되었던 삶,죽음,사랑이라는 인간의 삼대 난문에 도전한 것은 좋았지만 감히 도스토옙스키에 빰친다느니
하는 심사평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고 옴니버스식으로 엮어나가는 내용들이 상당히 작위적인 느낌이 강해
별로 공감도 되지 않은 뿐더러 그러다보니 소설에 몰입이 되지 않아 600쪽 이상이 되는 장편을 읽는 것이
좀 피곤한 독서 경험이 되었다. 책에 대한 찬사 일색뿐인데 내가 왜 이런 인상을 받았을까 의아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모르겠다 한번 더 읽어보면 내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소설을 굳이 다시 한번 더
읽고 싶은 생각은 없다. 저자의 글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소 진부하게 해설해 나가는
것은 독자들의 상상의 공간 즉 숨 쉴 공간을 축소시키게 되는데 저자 자신의 생각을 진부하게 나열하지 말고
소설의 분량을 반 정도로 줄여서 스토리를 좀 긴박감있게 끌고 갔으면 주제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내가 비록 문학평론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학에 조예가 깊은 것도 아니지만 내 취향과 생각이 그렇다는 것일 뿐.
"우상의 파괴" 라고 고 이어령 선생님을 세상에 알리게 된 글이 있는데 약관 23세의 나이에 당시 한국문단의
기라성같은 작가들을 비평하면서 한국 문학의 새로운 전기를 열게 만들었던 글인데
나는 문학이던 미술이던 예술 분야에서 종종 이 '우상의 파괴' 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와도 같이 생각해보곤 한다.
일본 소설 하나 읽으면서 슘페터까지 언급하고 글이 일없이 길어지는데 이만 줄이기로 하고.
왠지 일본 문학은 장편보다는 단편이 그리고 시도 단시(短詩)인 '하이쿠' 가 더 일본 문화와 정서에 어울리는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도 해본다.
소설에서 받았던 인상을 너무 과하게 표현한다 싶은 연극 장면 ㅋ
'책(Book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책 ) 파피루스의 비밀 (0) | 2022.06.20 |
|---|---|
| ( 책 ) 최고의 영예 ( No Higher Honor ) (0) | 2022.06.09 |
| ( 책 ) 번역에 살고 죽고 (0) | 2022.05.25 |
| ( 책 ) 지옥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0) | 2022.05.20 |
| ( 책 ) 이토록 매혹적인 아랍이라니 (0) | 2022.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