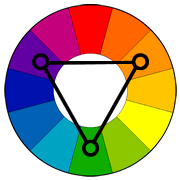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오랜만에 최인호의 소설을 읽는다.
고등학교 시절 신춘문예에 입선하여 문단에 등단한 이후 꽤 모던한 작가로서
필명을 날려왔던 작가인데 작년 2013년에 그의 나이 68세로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었던 기억이 새롭다.
최인호에 대해서는 내가 뭐 심도 있게 그의 문학세계를 공부한 적도 없어
뭐라고 평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내가 읽었던 그의 소설 몇 개 그리고
그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몇 자 써본다.
학창시절 뭔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방황하던 그 때 “깊고 푸른 밤”을
읽으면서 막연히 어떤 심연 속으로 가는 공감하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또 신문연재 소설 “불새”를 꽤나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 그러나 후반부에는
흥미가 반감되어 그냥 말았던 기억.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읽은 “상도”- 계영배라는 말 하나만 기억이 나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면 그의 역사 소설은 별로였다는 기억을 갖고 있고.
사실 최인호는 그의 소설을 읽어 보지 않은 사람들도 영화화 되었던
“별들의 고향”으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또 7080세대의
통기타가수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면서 마치 문학의 7080 아이콘처럼 인식되어
그의 문학 세계가 어쩌면 정통 문학보다는 대중 문학작가로서 인식되는
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 책을 쓸 당시는 그가 침샘암으로 심한 병 투병을 하고 있어 작가의 절박한
감회가 머리말에 절절하다.
그가 고백하듯이 천상 현대소설 작가이지 역사소설, 대하소설 작가는 아니며
마라톤주자보다는 단거리 스프린터라는 고백에 공감을 한다.
내 주관적인 평은 그의 문학적 재능은 짧은 긴장감 넘치는 현대적인 단편에
있지 그가 몇 개 썼던 장편 대하소설이나 역사 소설을 읽었을 때 그 구성의
어설픔이나 문체의 어색함이 당시 책을 읽으면서 많이 실망했던 기억들이
있다.
그도 그래서인지 본인 스스로 먼 길을 돌아와서 이제 현대소설을 쓴다고
머리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
운동선수도 그렇고 화가도 그렇고 각자 자기가 잘 하는 분야가 있는데
최인호는 그냥 시류에 따라 본인의 특기가 아닌 분야의 글을 써서
경제적으로는 좋아졌는지는 몰라도 문학사에서 그의 위치는 많이 손상이
되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솔직히 이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라는 소설은 작가가 뭔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막연하게나마 우리 현대인들이란 많은 다른 얼굴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혼자일 수 밖에 없는 존재의 고독함 등등
이 소설에서도 결국 해답을 얻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로 귀결되는 결론.
그런데 378쪽의 장편으로 만들다 보니- 물론 작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그런대로 타이트해도 내용은 산만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침샘 암으로 죽음을 앞둔 작가의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소회가 설명 식으로
여기저기 군더더기처럼 붙어있고 또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인지 실제 소설의 핵심과 그리 밀접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많은
기재도구들을 나열하여 소설이 좀 산만하다는 느낌도 든다.
또 성(sex)을 어떤 존재 방식의 확인으로서 과도하게 강조하는 느낌도 들고.
그림도 그렇지만 너무 디테일이 많고 보여주려는 시도가 많으면 답답하고
또 긴장감과 소위 integrity가 떨어지는데 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역시 최인호라는 작가는 단거리 스프린터의 재능을 갖고 있는데 욕심이
지나쳐서 장거리라는 무리를 하였다는 생각을 한다.
글을 쓰다 보니 고인이 된 작가의 유작에 대해 호평을 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어차피 작가는 작품으로서 평을 받는 것, 그리고
이건 단지 내 개인의 주관적인 취향에 의한 평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책(Book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에드바르 뭉크- 사공아트 발행 (0) | 2014.07.07 |
|---|---|
| 템테이션(temptation)- Douglas Kennedy (0) | 2014.06.28 |
| 제3인류-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0) | 2014.06.15 |
| 동양철학 에세이- 김교빈 지음 (0) | 2014.06.11 |
| 만화의 이해(Understanding Comics) (0) | 2014.05.29 |